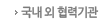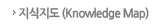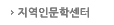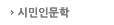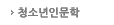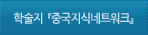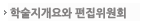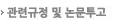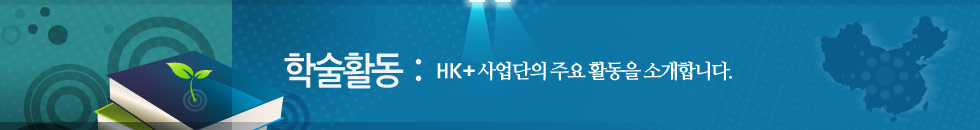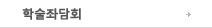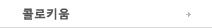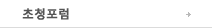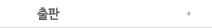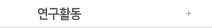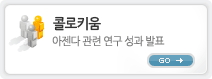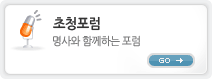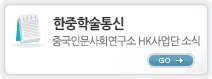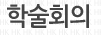홈 > 학술활동 > 학술회의
제 1주제 : 러시아의 학문구조와 문화학의 등장
발표 : 조유선(국민대)
토론 : 최정현(한양대)

현대 러시아의 학문구조와 문화학의 등장
주지하다시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단순히 정치적 상부구조와 생산 관계의 변화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지식 담론의 주 영역인 교육 및 학문, 언론, 예술 부문 전반에 걸친 심대한 지각변동을 동반하였다. 체제전환과 동시에 맞닥뜨린 민주화와 시장화에의 요구 그리고 동시대 전 세계적 흐름인 지구화의 여파는 이 같은 변동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학문장(場)의 변화는 다른 어느 나라나 사회에서보다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양하며 역동적인 모습을 띤다.
학문 영역에서 포스트소비에트의 대표적 징후는 러시아 대학에서 오랜 시기 굳어져 온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기존 구도가 해체되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난다. 소비에트 시기 ‘정치국’이 실질적인 최고 국가기관이자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학문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였다. 물론 ‘국가학’이라는 형태를 띤 제정 러시아에서의 제반 논의들을 포함해 주로 정치경제학이나 이데올로기, 조직 등을 다루는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구식 학문장과 비교해볼 때 사회과학이 일정한 방법론과 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교육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 시기 빈약한 사회과학의 위상은 당-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함에 따라 학문의 다양성과 사회적 갈등의 토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통상적인 사회과학의 역할은 일정부분 문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의 몫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혁명의 정당성과 당파성, 사회주의 건설의 당위성, 역사의 발전과정과 필연성에 대한 해석등은 주로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에서 다루어졌다. 비록 인문학 또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 이론 등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하는 한계를 지녔지만, ‘문학 중심주의’(литератуа центризм)의 전통을 지닌 러시아 학문장에서 특히 문학이 선도한 강한 인문주의는 소비에트 시기 인문학 ‘과잉’의 학문구조를 가능케 하였다. 이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전통적인 학문구조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가운데 인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더 극적인 변화를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무게중심이 바뀌어가는 새로운 학문장에서 이전 체제의 속성상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분과학문들, 즉 경제, 경영, 법과 같이 현실적 수요가 강한 영역들 뿐 아니라 과거 주변부에 머물며 서구식 연구 주제나 방법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사회학과 심리학, 또한 분과학문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정치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은 일종의 ‘젊은 학문’으로 주목받으며 재구성되고 있다. 한편 인문학의 경우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특히 시장화의 영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탄한 전통을 배경으로 여전히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행 하에 연구 대상이나 방법론에서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함에 따라 인문학은 그 간 축적된 지식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과거 인문학 담론의 주변부에 머물던 ‘문화학’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로운’ 학문으로 주목받으며, 인문학을 넘어 분과학문간 경계를 교차, 횡단하는 이른바 21세기형 통합학문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 같은 문화학의 등장은 그 발전 속도와 놀랄만한 양적 규모의 확장 그리고 학문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학문장의 가장 ‘문제적’ 이슈들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오늘날 러시아 학문구조의 재구성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문화학의 실상과 현주소를 그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학과 문화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 학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연구/문화학을 둘러싼 경기과열 현상과 그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학문체계의 형성에서 러시아 문화학이 자신의 전통과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며, 학문의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가는 지를 보여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